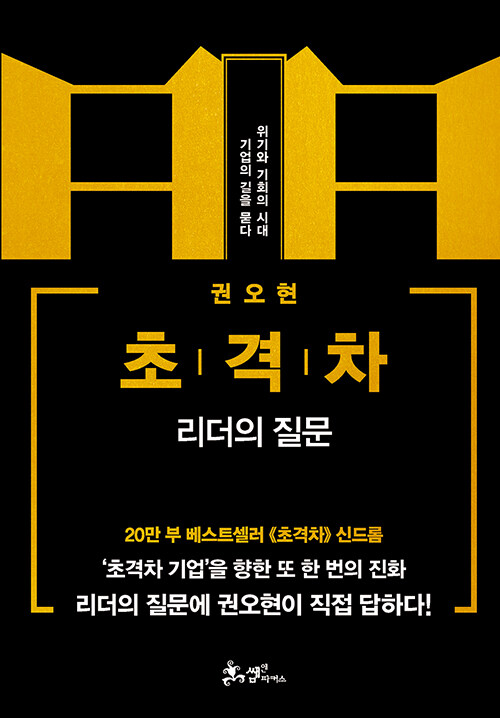직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기업의 몰락
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틀리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식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학생들은 여전히 '틀리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하나라도 덜 틀리는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기에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 틀리는 사람이 소위 일류 대학에 가게 됩니다.
실수 없이 일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문화 속에서
'사고 안 내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추구해온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것을 카피하더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사례를 연구한 뒤
그들이 실수한 것은 피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기업이
실력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실력이 없는 기업은 실수까지 베껴서 C를 받는 것이지요.
"잘 베끼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 아닌지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피할 게 없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기업과 유사한 사업 모델을 따라 하는 기업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실수할 수 밖에 없겠지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던 기업들은
아예 새로운 것을 회피하거나
설령 시도하더라도 기존의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사고가 안나는 방향으로 어설픈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창업자든 후계자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경영인,
일 잘하는 리더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관리인이 됐습니다.
경영인이 아니라 '전문 관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문 관리인이 되어 조직 내에서 쓸데없이 세세한 것까지 다 관여하게 되고,
리더로서 실력은 안 느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시대와 역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 실수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오현 지음, 김상근 정리, 2020, 『초격자 - 리더의 질문』, 샘앤파커스, 19-20쪽.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학사와 KAIST 석사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았다.
1985년 삼성전자 입사 후 33년간 재임하며 반도체총괄 사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초격차』, 『초격차: 리더의 질문』 등이 있다.